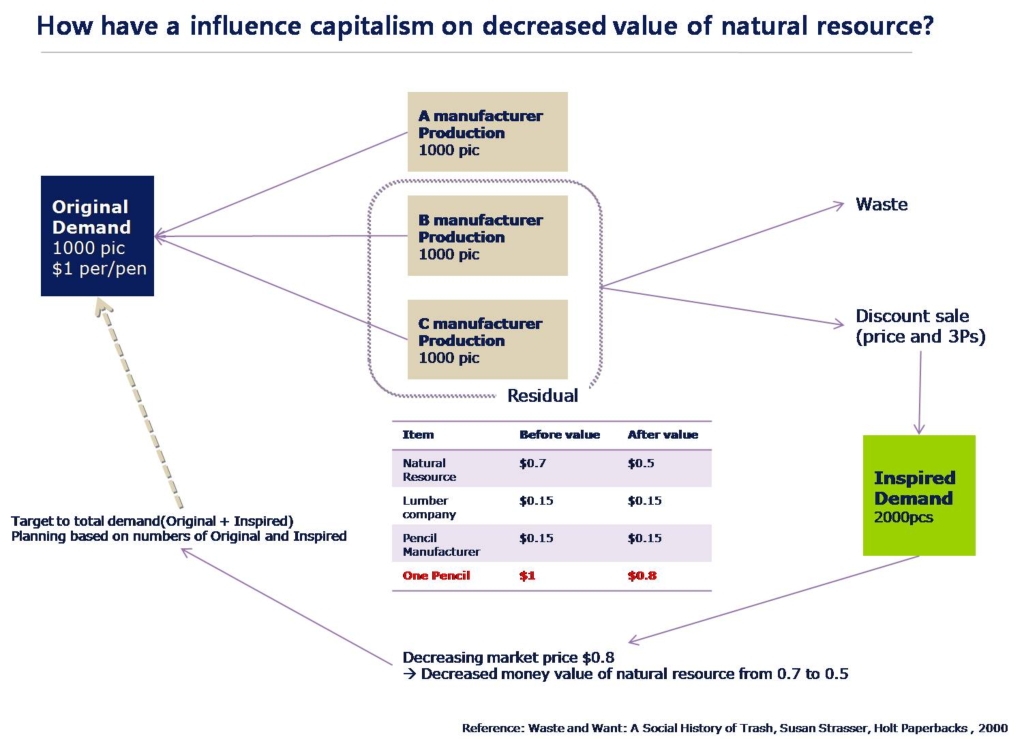http://cafe.naver.com/investclass/369 에서 일부 + 기타 여러 소스 정리
자기자본이익률(ROE)
=
당기순이익/(기초자본+기말자본)/2 * 100%
= 당기순이익/연평균자본 * 100%
= Net Income *
Sales * Assets
Sales Assets Equity
=
Profitability * Activity * Solvency
= 당기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산 * 총자산/총자본
=
Net Income/Assets * Assets/Equity
= ROA *
Assets/Equity |
1. ROE의 의미
순이익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이익을 당해년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Return On Equity)이며, 주주들의 투자수익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ROE는 장기저축예금의 금리 이상은 되어야 한다. ROE가 은행의 금리보다 낮으면 경영자가 충분한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순이익이 줄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줄여서
ROE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총자산 순이익률(ROA)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자기자본(=주주자본) = 납입자본 + 누적이익잉여금
2. ROE의 구조적 분석
■ ROA
= 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 당기순이익률 * 자산회전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매출액/총자산)
총자산 순이익률, ROA(Return On Assets)는 기업의 전재산인 자산을 투입하여 순이익을 얼마나
획득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당기순이익/자산*100"으로 구한다.
ROE와 마찬가지로 판매마진을 높이거나 각종 자산의 회전율을
높여야만 ROA를 끌어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 * 총자산 회전률(매출액/자산)"으로 분해할 수
있다. 즉 총자산 순이익률을 증가시키려면 순이익률을 높이거나 총자산 회전율을 늘려야만 한다.
만일 순이익률은 높으나 자산 회전률이 낮으면
판매마진은 높았으나 판매활동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반대의 경우라면 판매마진은 낮았으나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하게
된다.
고객의 예탁금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금융업종에서는, ROE로는 전체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ROA를 대표적인
성과지표로써 활용하고 있다. 워렌 버핏은 우수한 금융업종 기업이라면 1% 이상의 ROA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ROE
= ROA * 재무레버리지(A/E)
= 당기순이익률 * 자산회전율 * 재무레버리지
= 당기순이익률 *
자본회전율
□ 자산회전율: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
=
매출액/자산
□ 자본회전율: 주주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
=
매출액/자본
□ 재무레버리지: 자기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도
즉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로서 타인자본을 얼마나 지렛대
로 활용하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
상기의 수식에서 보듯이 ROE가 증가한다는 것은
▷ 순이익이 증가한다
▷ 매출이 증가한다
▷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 매출과 순이익 증가하여야 한다
▷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 매출과 순이익 증가하여야 한다
▷ 타인자본을 활용하여 매출액이 늘어나는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난다면, ROE도 높아진다
등의 도해가 가능할 듯 싶다....
3. ROE의 유용성
ROE는 기업이 내재가치를 분석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적정한 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ROE는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구책했는 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자본에 비해 높은 이익을 올리는 기업만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ROE가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단순한 이익의 성장율이나 매출성장율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회계상의 이익은 분식으로 인해 왜곡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익성장율과 같은 단순한 개별지표를 평가하는 것보다 모든 지표가 혼합되어 있는
ROE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면 그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투자자들은 상기의 수식과 도해에서 보듯이 ROE가 높은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해야 한다. ROE가 높은 기업은 순이익성장률이 높고
매출액성장률이 높으면서도, 꾸준히 자기자본 즉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장부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주이익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OE가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가치/가격지표인 PER와 PBR의 진정성과 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비율만큼
주가대수익비율과 주가대순자산비율도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의미로서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예측가능성과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다
4. ROE 평가 시 몇 가지 고려사항(ROE의 왜곡)
① 과다한 재무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
ROE가 높은 기업중에서도 이자부부채인 차입금의 비중이 적은 기업일수록 ROE의 순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투자가치가 높다. 재무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ROE의 분자값인 당기순이익을 왜곡시킬 수 있는 과다한 재무레버리지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의 순도가 떨어진다. 물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차입금조달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달성한다면 나쁠 건 없지만, 기업이 항상
타인자본조달 비용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는 없다. 또한 과다한 재무레버리지 활용은 기업에 불황이 닥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차입금의
이자비용이라는 고정비의 증가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②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고 있는 지, 배당성향을 높이고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
기업은 순이익으로 재투자를 할 것인 지 내부유보를 할 것인 지 결정을 한다. 재투자나 자본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내부유보한 돈은 주주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고, 남은 최종적인 돈은 이익 잉여금의 증가와 함께 주주자본인 자기자본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ROE값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전에 없이 대폭 증가시킨다든지, 자사주를 대폭 매입한다든 지를
살펴야 한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감소할 ROE를 감안하여, 자기자본 증가에 기여할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남아도는 내부유보금을 대폭적으로 주주환원정책으로 사용하여 ROE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배당의 함정이 있다. 양날의 칼과 같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기 마련이다.
③ 일회성이익의 증가에 의해 ROE가 증가하는 지도 살펴야 한다.
기업은 부동산/유가증권 매각이익 및 대손충당금 환입이나, 모회사에서의 분사 등에 의해서(자기자본이 줄어듬) 등의 일회성이익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ROE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상이익의 세부항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④ ROE가 꾸준한 지 변동폭이 큰 지 살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하게 ROE가 꾸준한 기업이 좋다. ROE는 5년 이상 10~25%를 꾸준한 수치로 유지하는 기업이 좋다.
ROE가 한
해는 좋았다가 두 해는 나쁘고 변동폭이 큰 기업은 일시적인 호황의 부산물이거나 경기순환적인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ROE가 일시적 호황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익극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모멘텀 플레이는 가능하다.
기업의 현재가치가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값이라는 고리타분한 DCF 가치평가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ROE의 꾸준함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장기 이익과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정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